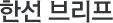250210_brief.pdf
250210_brief.pdf
Hansun Brief 통권341호
1.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전쟁의 시작
2. 이민 및 마약 정책과 연계된 관세 정책
3. 중국과의 미래 주도권 전쟁
4. 한국의 대응 방안
1.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전쟁의 시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지난 1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유럽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 마약 펜타닐 유입 방지 및 불법 이민자 대응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세 부과가 한 달간 연기되었다.
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기존에는 관세가 없던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한국기업들은 캐나다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원료를 이용하고,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2. 이민 및 마약정책과 연계된 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은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만은 아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우선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안전한 미국, 풍요로운 생활과 에너지 독립성, 적폐 청산 미국의 가치 회복’이다. 이를 보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하여 경제적 우월성을 회복하려는 목적 외에도, 이민, 마약, 에너지 주권, 미국의 가치 회복 등 비경제적 요소가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이민 및 마약 대응 정책이 발표된 이후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기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3. 중국과의 미래 주도권 전쟁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좀 더 복잡하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발표하였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 추가 관세와 원유, 농기계 등 72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 전쟁은 최대 무역 적자국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2,794억 달러로 2위 국인 멕시코(1,524억 달러)의 거의 1.8배로 많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4차 사업혁명 시대의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래 주도권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주도권을 잡는 경제적 위치를 벗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주요국 간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달러 강세를 조정하였다. 당시 미국에 대항할 만한 경제강대국이 없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점유율이 1980년 미국이 26.64%였을 때 중국의 점유율은 1.5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이르면 미국(23.86%)은 하락하였으나, 중국(17.68%)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무역(수출과 수입의 세계무역 비중) 비중도 보면 1985년에 미국은 15.28%였으나 중국은 1.4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이르면 양국이 11%대에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세계 경제 구조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중국에 비해 그만큼 하락하여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급성장과 고급기술 부문에 대한 기술 향상은 미래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보면 중국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 대만의 첨단제조업의 수준에 대한 우려도 같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에 대하여 한국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새로운 무역 질서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관세인상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세계화(globalization)의 후퇴로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대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과거 정치나 가치와 무관하게 경제적 요인만을 고려하는 신고전파적 세계화는 쇠퇴하고 조건부적 세계화(conditional globalization)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정책 우선순위나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세유예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무역 적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민아니 마약과 같은 다른 요인을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만을 본다면 2023년 기준으로 베트남(1,046억 달러), 독일(830억 달러)이 우선적인 관세인상 대상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 적자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은 미국과 514억 달러 흑자국으로 미국 관점에서 8번째 적자국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인상을 통한 수출감소가 아닌 수입 증가를 통한 무역확대 및 무역 적자 해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수입국으로부터 수입국을 전환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방위비 분담 증가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전략산업의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서 전략적 산업을 활용한 협상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조선산업에 대한 전략적 정책이다. 미국에 조선소를 설립하여 건조를 돕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선박을 한국에서 유지·보수해 주는 방안이 있다. 그 외에 원자력산업을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 국내에 건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틈새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줄이는 산업 부문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상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본고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셨다면 068801-04-137381(국민은행)로 후원해 주세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조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