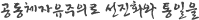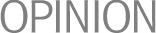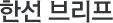230605_brief.pdf
230605_brief.pdf
1. 돌아오지 못한 낯선 영웅들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름 없는 산과 들, 그리고 물에서 스러져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웅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후세가 새겨넣은 국립현충원 현충탑 석문(石文)이다. 국립현충원의 모든 현충탑에 새겨진, 해와 달이 되어 우리를 지켜온 수많은 영웅들이 그러하듯 이들은 모두 낮에는 해가 되어 비추고 밤에는 달이 되어 지켜주고 있다. 이 영웅들은 모두 2023년 6월 6일 제68회 현충일에도 한 생명 모두 바쳐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지킬 것이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한 생명을 모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귀환 신고를 마치지 못한 영웅들은 이곳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있다. 무려 8만여 명이 넘는 국군 용사들이다. 이들은 70년째 우리 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바로 우리들에게 ‘국군포로’라는 오래된 ‘낯선 명칭’으로만 남겨진 이들의 존재는 국립현충원의 현충탑 석문에 오르지 못했다. 70년 전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초개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들의 존재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지난 2018년, 우연한 계기로 ‘국군포로 귀환 용사’를 알게 되어 매년 그를 찾아 소식을 나눴다. 그의 나이 올해 95세(유영복. 1929년생, 호적상 1930년생)다. 오래되었으면서도 낯선 그의 존재는 ‘국군포로 귀환용사’다. 유 선생님은 대한민국 육군 제5사단 27연대 3대대 3중대 1소대(군번 9395049) 소총병으로 참전해 정전협정 직전이던 1953년 여름 강원도 김화지구로 배치됐다. 그리고 그는 북한 조선인민군·중국 인민지원군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억류되면서 귀환하지 못했다.
비단 그가 넘어가지 못했던 것은 군사분계선만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도 포함된다. 그가 5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지 못하고 북한의 검덕광산에서 묶이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졌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동료들 중 약 8만여 명이 넘는 우리 국군 용사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조국으로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북한의 이름 없는 산과 들, 해가 들지 않는 어두운 검은 흙 속으로 흩어진 8만여 명의 국군용사들은, 조국에서는 군번 잃은 미(未)귀환 장병 혹은 실종 군인이라는 오명(汚名)(?)으로 덧씌워져 무려 40여 년간 그들은 잊혀진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된 이들 국군 용사들은 북한 당국의 위협과 감시 속에서도 탈출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어느 국군 소위는 광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함께 하는 전우들과 광산 폭파를 기도했으나 발각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탈출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구책이었지만, 같은 시기 그는 조국에서 단순히 실종 군인이라는 오명을 받은 채 끝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가 뛰어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억류하고 있는 북한의 감시용 울타리나 맹견의 추격뿐만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이기도 했다. 6.25 전쟁은 약 3년 만에 잠시 멈추었지만, 억류된 국군 용사들에게는 지난 70년 역시 그들에게는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이었다.
6.25 전쟁이 발발한지 거의 반세기에 다다른 지난 1994년, 조국이 잊고 지냈던 이들의 존재는 고(故) 조창호 소위가 북한에서 자력 탈출해 귀환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를 시작으로 약 80여 명의 억류된 국군 용사들은 죽음의 북한 땅을 자력 탈출해 조국으로 돌아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지지 못한 많은 용사들이 조국 땅을 밟기 위하여 50년의 세월을 넘어가던 중 이름 없는 흙이 되고, 그리고 물이 되었다.
조국의 땅으로 넘어오기 위하여 5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뛰어넘은 조창호 소위는 북한에서의 강제노역으로 인한 지병 악화로 2006년 11월 19일 우리 곁을 떠나 민족의 얼이 서린 현충원에 잠들었다. 현충원에 잠들기 전, 그가 조국에게 남긴 바람은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군 포로 용사들을 귀환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돌아오지 못한 8만여 명의 우리 용사들을 조국이 나서서 데리고 와야 한다는 피맺힌 말이었다.
지난 2006년 11월, 고(故) 조창호 중위가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 곁으로 돌아온 국군포로 귀환 용사는 100여 명이 되지 않는다. 2023년 6월 현재, 살아남은 귀환 용사들은 이제 10여 명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90세를 넘기거나 혹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소원은 모두 하나같이 조국을 위해 싸웠던 그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6월, 필자와 만났던 유영복 선생님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동료들, 함께했던 전우(戰友)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필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가 이날 지난날을 기억하던 중 필자에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며 자신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를 것이라던 바람은, 잊혀졌던 전우들의 존재인 ‘미귀환 국군포로 용사’의 존재를 후세가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2. 낯선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초개(草芥)와 같이 쉽게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두에게 생명은 단 하나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70년 전 국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한 이들 미(未)귀환 용사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투를 벌였던 ‘낯선 영웅’인 셈이다.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와 관계없이, 이들은 국군 소속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낯선 인물들일 수는 있어도,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려오고 있는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들 국군포로 용사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낯선 이름인 ‘국군포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이 아니라 무려 40년이 지난 1994년이다.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조국을 위해 싸우던 용사들이 귀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그들은 스스로 북한을 탈출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비록 그들을 잊었지만, 그들은 조국의 품으로 살아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더 오랜 시간과 죽음의 장벽을 넘어야 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끝내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용사들은 약 8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국방부 어디에도 국군포로 용사들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필자가 만났던 국군 귀환용사들은 하나같이 과거 생사를 넘나들면서 조국으로 돌아오던 그날의 기억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하여 많은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유영복 선생님은 그 무엇보다도 귀환 신고를 마친 후 서울 땅을 밟았을 때,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에 대하여 꼬박 50년간 제사를 지내던 늙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가슴이 가장 미어졌다고 필자에게 밝혔다. 참전하기 전 자신이 보살폈던 가족들이 잘 살아있기를 바랐는데, 아버지가 그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귀환 신고 후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지만 아버지와 재회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조국은 그를 잊었지만 당신은 자신의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렸는데, 다시 만난 지 불과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신을 기다리며 유일하게 기억해준 아버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유 씨는 귀환 신고를 받아준 조국에 대하여 하염없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는 심정을 전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조국이,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조국이 산업화를 거쳐 세계 강국이 되었음을 눈으로 보고 마치 꿈만 같다고 밝혔다. 낯선 영웅, 잊혀져 가던 영웅이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조국은 그를 잊고 있었지만 그는 50년 동안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계속 기억해야 하고, 또한 애타게 찾아 불러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이 경구는 지나간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한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68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과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즉 우리에게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잊혀진, 갇힌 역사로 간주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쳤던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조국을 지키려고 헌신하려고 하겠는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마지막으로 유영복 선생님의 당부는 필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들의 존재를 부디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당부는 국립현충원 혹은 전쟁기념관 등에 끝내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 죽음의 땅에서 한(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국군 용사들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위령현충비(慰靈顯忠碑)만이라도 남겨달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들을 위한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었다. 아니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던 용사들, 돌아오지 못한 그들의 마음만이라도 후대가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절규였다. 그의 바람과 절규가 이번 현충일을 맞아 <잊혀진 기억>이 <생생한 역사>로 부활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