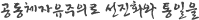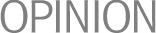2020-06-18 13:11:41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칼럼입니다.
보수 야당이 환골탈태를 모색하고 있다. 양 진영을 넘나든 비대위원장은 ‘보수’라는 용어조차 꺼린다. 그는 좌파 의제를 선점하자는 주장까지 폈다. “존재 자체가 민폐인 좀비 정당”이라는 누구의 일갈보다 더 나아간 셈이다.
그가 부각한 ‘빵 먹을 자유’는 정치의 으뜸 본령이긴 하다. 하지만 민심을 얻고자 보수의 핵심 가치마저 버리고 ‘보모(保母)국가’(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를 지향해선 안 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정책 기조를 갱신하면 된다. 1981~2009년 진보와 보수가 복지로 경쟁하다가 파산한 그리스가 타산지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닮은 듯 다른 반면교사다. 백인 근로자 표심을 겨냥한 그의 반(反)이민, 보호무역, 고립외교와 편 가르기는 보수 본류와 배치된다. 역설적으로 미국 보수엔 2016년 대선 승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됐다.
‘보수’라는 용어엔 ‘수구 꼰대’ 이미지가 내장돼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정당들이 수시로 문패를 갈아치우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름 세탁은 정공법이 아니다. 영국 보수당은 1834년 창설됐다. 기껏 17년 존속했던 우리나라 최장수 민주공화당에 비할 바 아니다. 당명은 낡았지만, 보수당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걸맞은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해 왔다. 2차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치로 노동당 정부가 채택한 ‘비버리지 사회보장 구상’도 보수당 정부 때 마련됐다. 당명보다 정강 정책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사례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우파는 양대 기둥인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경합하면서 진화했다. 전자는 인권, 가족과 공동체, 정통 종교와 도덕, 시민사회와 공화주의를 강조한다. 후자는 법치와 사유재산권,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에 방점을 둔다. 사회적 보수주의가 정치의 지향점을 부각한다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 경로와 수단의 성격을 띤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의 모태가 된 ‘부(負)의 소득세’와 세계적 히트상품이 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양자가 뜻을 모은 대표작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가 보강할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미국 ‘정부책무연구원’ 원장 피터 슈바이처는 저서 ‘생산자와 수취자(Makers and Takers)’에서 보수의 덕목을 이렇게 열거했다. “보수층은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 행복해하며, 가족과 더 가깝고 마약은 덜 한다. 그들은 기부에 너그럽고 더 정직하며 덜 물질적이고 질투나 남 탓을 덜 한다. 심지어 자녀를 더 자주 껴안는다.” 지나친 일반화이긴 해도 보수 우파의 항로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무릇 평민의 주된 관심사는 가족 보전과 자산 축적이다. 이 둘을 아우르는 연결고리는 ‘일하는 양부모 가정’이다. 바로 이것이 보수의 최우선 의제다. 방향은 엉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과 보호무역 정책도 여기에 착안했기에 먹혀들었다.
4·15 총선을 돌아보면 보수 야당은 콘텐츠가 빈약했다. 그저 반대하거나 여당 공약을 흉내 내기에 급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정쩡한 아류에 그쳤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가을 신학기에 대해선 말문을 닫았다. 이왕 늘릴 재정지출이고 일자리 만들기라면 간벌과 수종 개량, 지류·지천 정비 등 멀리 내다본 생산적인 대안도 적지 않았는데 아쉽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19로 각국 정부는 장악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입법과 행정은 관성과 하방 경직성을 지녀서 늘어난 인력과 예산, 강화된 규제는 좀비처럼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국민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내성이 생겼다. 보수 야당이 최후 보루다. 정책 기조를 보강한다며 이런 흐름까지 부채질해선 안 된다. 오히려 무상복지 기대를 낮추고 정부 규제로 얻은 기득권은 줄이도록 유권자에 읍소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힘을 받으려면 야당도 무엇이 됐든 솔선해 내려놔야 한다. 잃지 않으면서 얻긴 어렵다. 자유와 정의,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참신한 정책도 절실하다. 동서고금에 숱한 선례가 있다. 시전(市廛)의 상권 독점을 없앤 정조의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과 이승만 대통령의 1949년 농지개혁이 그랬다. 영국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의 1807년 노예교역 금지법과 일본 건국을 이끈 덴포기(天保期·1830~1845년) 사무라이의 막부 해체에서도 배워야 한다.
그가 부각한 ‘빵 먹을 자유’는 정치의 으뜸 본령이긴 하다. 하지만 민심을 얻고자 보수의 핵심 가치마저 버리고 ‘보모(保母)국가’(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를 지향해선 안 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정책 기조를 갱신하면 된다. 1981~2009년 진보와 보수가 복지로 경쟁하다가 파산한 그리스가 타산지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닮은 듯 다른 반면교사다. 백인 근로자 표심을 겨냥한 그의 반(反)이민, 보호무역, 고립외교와 편 가르기는 보수 본류와 배치된다. 역설적으로 미국 보수엔 2016년 대선 승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됐다.
‘보수’라는 용어엔 ‘수구 꼰대’ 이미지가 내장돼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정당들이 수시로 문패를 갈아치우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름 세탁은 정공법이 아니다. 영국 보수당은 1834년 창설됐다. 기껏 17년 존속했던 우리나라 최장수 민주공화당에 비할 바 아니다. 당명은 낡았지만, 보수당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걸맞은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해 왔다. 2차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치로 노동당 정부가 채택한 ‘비버리지 사회보장 구상’도 보수당 정부 때 마련됐다. 당명보다 정강 정책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사례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우파는 양대 기둥인 사회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경합하면서 진화했다. 전자는 인권, 가족과 공동체, 정통 종교와 도덕, 시민사회와 공화주의를 강조한다. 후자는 법치와 사유재산권, ‘자생적 질서’와 시장경제에 방점을 둔다. 사회적 보수주의가 정치의 지향점을 부각한다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 경로와 수단의 성격을 띤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의 모태가 된 ‘부(負)의 소득세’와 세계적 히트상품이 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양자가 뜻을 모은 대표작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가 보강할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미국 ‘정부책무연구원’ 원장 피터 슈바이처는 저서 ‘생산자와 수취자(Makers and Takers)’에서 보수의 덕목을 이렇게 열거했다. “보수층은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 행복해하며, 가족과 더 가깝고 마약은 덜 한다. 그들은 기부에 너그럽고 더 정직하며 덜 물질적이고 질투나 남 탓을 덜 한다. 심지어 자녀를 더 자주 껴안는다.” 지나친 일반화이긴 해도 보수 우파의 항로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무릇 평민의 주된 관심사는 가족 보전과 자산 축적이다. 이 둘을 아우르는 연결고리는 ‘일하는 양부모 가정’이다. 바로 이것이 보수의 최우선 의제다. 방향은 엉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과 보호무역 정책도 여기에 착안했기에 먹혀들었다.
4·15 총선을 돌아보면 보수 야당은 콘텐츠가 빈약했다. 그저 반대하거나 여당 공약을 흉내 내기에 급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정쩡한 아류에 그쳤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가을 신학기에 대해선 말문을 닫았다. 이왕 늘릴 재정지출이고 일자리 만들기라면 간벌과 수종 개량, 지류·지천 정비 등 멀리 내다본 생산적인 대안도 적지 않았는데 아쉽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19로 각국 정부는 장악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입법과 행정은 관성과 하방 경직성을 지녀서 늘어난 인력과 예산, 강화된 규제는 좀비처럼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국민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내성이 생겼다. 보수 야당이 최후 보루다. 정책 기조를 보강한다며 이런 흐름까지 부채질해선 안 된다. 오히려 무상복지 기대를 낮추고 정부 규제로 얻은 기득권은 줄이도록 유권자에 읍소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힘을 받으려면 야당도 무엇이 됐든 솔선해 내려놔야 한다. 잃지 않으면서 얻긴 어렵다. 자유와 정의,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참신한 정책도 절실하다. 동서고금에 숱한 선례가 있다. 시전(市廛)의 상권 독점을 없앤 정조의 1791년 신해통공(辛亥通共)과 이승만 대통령의 1949년 농지개혁이 그랬다. 영국 윌리엄 윌버포스 의원의 1807년 노예교역 금지법과 일본 건국을 이끈 덴포기(天保期·1830~1845년) 사무라이의 막부 해체에서도 배워야 한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773 | [스카이데일리] 언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더니 | 20-12-18 |
| 1772 | [동아일보] 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 | 20-12-18 |
| 1771 | [문화일보] 팬덤에 함몰된 文정권, 다수에 기대 민주주의 파괴하는 연성독재로 타락 | 20-12-16 |
| 1770 | [데일리안]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동맹 준비되고 있나? | 20-12-15 |
| 1769 | [머니투데이] 상법 개정한 국회, 무슨 일 했는지 알까 | 20-12-15 |
| 1768 | [여성신문] 미래 세대는 여성 서울 시장을 원한다 | 20-12-14 |
| 1767 | [아주경제] 韓금융, 중국으로 가자 | 20-12-11 |
| 1766 | [국민일보] 자만 불감증의 독배 | 20-12-10 |
| 1765 | [뉴데일리] 지나친 음모론은 민주주의 위협…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 20-12-09 |
| 1764 | [중소기업뉴스]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내년말까지 재연장하라 | 20-12-09 |
| 1763 | [서울경제] 법무부 장관은 ‘헤드십’이 아닌 ‘리더십’ 보여야 | 20-12-07 |
| 1762 | [주간한국] 윤석열 징계 추진 추미애 장관 '사면초가' | 20-12-07 |
| 1761 | [아시아경제] 이게 나라인가? | 20-12-07 |
| 1760 | [대전일보] 불통과 침묵은 파멸의 전주곡이다. | 20-12-04 |
| 1759 | [충남일보] 미국 대선 불복, 트럼프가 넘지 못할 벽 | 20-12-04 |
| 1758 | [세계일보] 안보역량 훼손하는 대공수사권 이관 | 20-12-04 |
| 1757 | [아시아경제] 미국 차기 행정부를 맞는 북한의 고심 | 20-12-03 |
| 1756 | [여성신문] 여전히 여성은 희망이고 미래다 | 20-12-03 |
| 1755 | [문화일보] 부동산 ‘죄악세’ 부과로 조세저항… 文정권 핵심 지지층도 이반 조짐 | 20-12-03 |
| 1754 | [매일신문] 불통과 침묵은 파멸의 전주곡이다 | 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