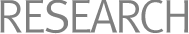[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안 바꾸면 미래 없다
경기도 용인의 한국외대부고 3학년 김재경(19)양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 세 명 중 한 명이다. 이번 수능은 6년 만에 가장 어려웠다고 해서 ‘불수능의 귀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 수험생 55만 명을 곤혹스럽게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수시모집에 당당히 합격한 만점자의 흔적은 교과서와 문제집에 그대로 나타난다. 국어영역 문제집은 6개월 이상 반복해 보고 또 봤다. 그가 치른 수능 국어영역 45개 문항 중 25개는 ‘다음 중 OO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9개는 ‘다음 중 OO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는다. 출제위원이 제시한 것 중에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다. 수능은 1994년 탄생부터 지금까지 정답을 찾으라고 수험생에게 요구했다.
취재팀은 김양에게 수능과는 다른 대입 시험을 제공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한국어시험이다. 이 시험은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IB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이 주관하는데 유럽은 물론 미국·일본의 대학도 이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김양이 받아든 문제지는 2015년 5월 치러진 IB 한국어A(문학)다. 장편소설·중단편소설·시·희곡·수필의 15개 문제 중 하나만 골라 2시간 동안 푼다. 7번 문제는 ‘정형시와 자유시 작품을 각각 골라 시인들이 시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들의 효과는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시오’다. IB는 수능과 달리 정답을 고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김양은 두 시험체제를 이렇게 비교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